뉴스 개요
1. Fast Company 언론사: GM, 400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새로운 EV 배터리 기술 공개
- 발행일: 2025년 5월 14일
- 내용: General Motors(GM)는 리튬 망간 리치(LMR, Lithium Manganese-Rich) 배터리 기술을 공개했다. 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저렴한 망간을 주로 사용해 비용을 절감하며, 전기 트럭에서 400마일(약 644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제공한다. GM은 LG 에너지솔루션과 협력해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며, 2027년 말 파일럿 생산을 시작한다. LMR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 사용을 줄이고, 프리즈매틱(직사각형) 셀 디자인으로 부 Idiot품 수를 50% 줄여 무게와 비용을 낮춘다. GM은 이 기술로 전기 트럭과 대형 SUV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 세부 사항: LMR 배터리는 리튬철인산(LFP) 배터리 수준의 저렴한 비용과 33%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제공한다. GM은 2015년부터 LMR 연구를 시작했으며, 300개의 풀사이즈 셀 프로토타입으로 150만 마일 주행에 해당하는 내구성을 검증했다. 이 배터리는 고성능 NMCA(니켈-망간-코발트-알루미늄)와 저가 LFP 사이의 중간 옵션으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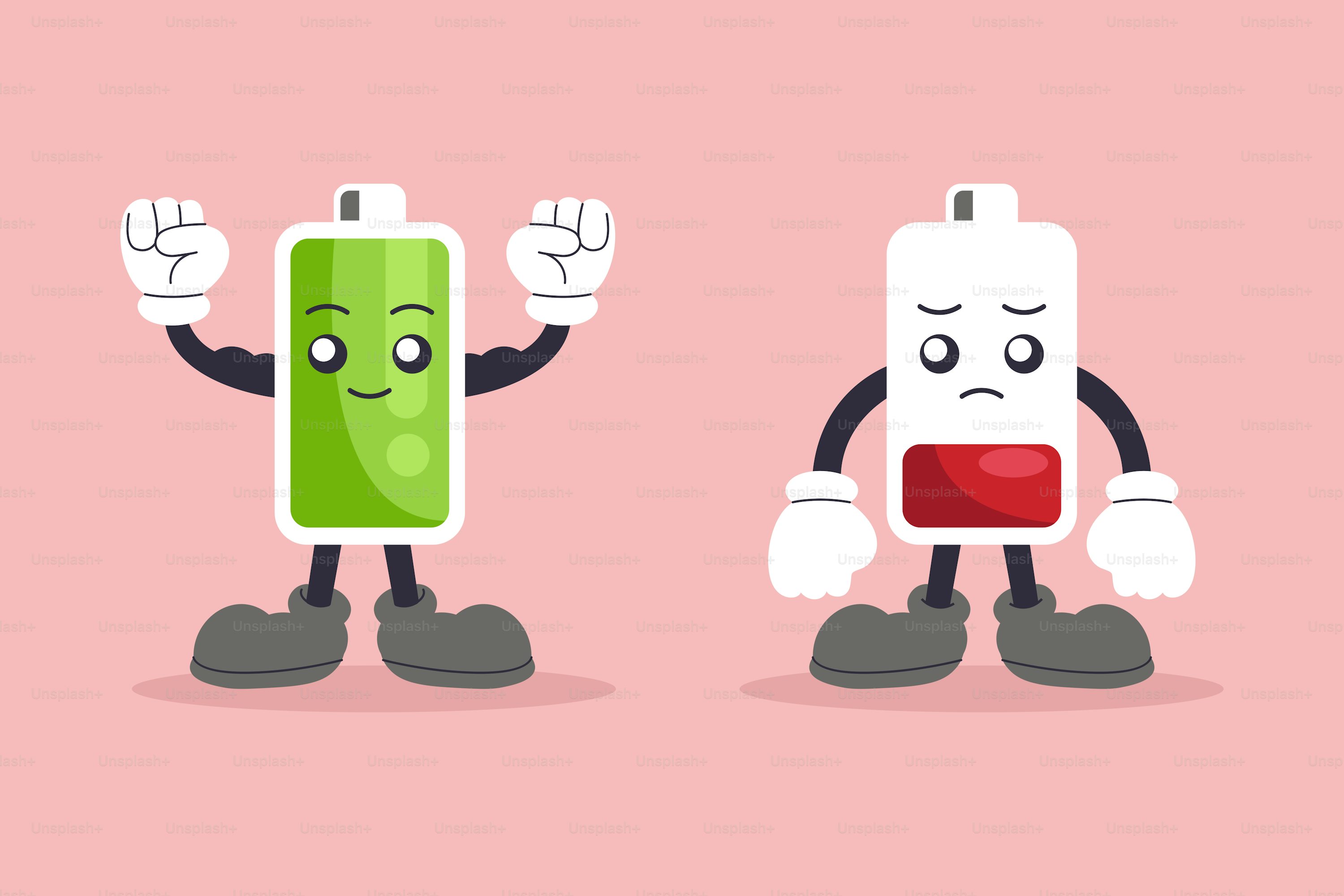
2. MIT Technology Review: 관세, 배터리에 악재
- 발행일: 2025년 4월 9일
- 내용: 미국 배터리 산업은 중국산 배터리 및 원자재에 대한 높은 관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리튬이온 배터리 25%, 코발트·니켈 등 25%)는 배터리 비용을 높이고 공급망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는 전기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수요를 억제한다. GM은 망간 중심의 LMR 배터리와 루이지애나 망간 공급망(Element 25 투자)을 통해 관세 영향을 줄이려 하지만,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 세부 사항: 중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원자재(코발트, 니켈, 리튬)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위해 망간 등 대체 원자재와 지역 생산에 투자하고 있다. GM의 LMR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북미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배경
- GM의 전략: GM은 Ultium Cells(GM-LG 합작)를 통해 북미 최대 배터리 제조사로 자리 잡았다. LMR 배터리는 프리미엄 전기 트럭과 SUV에 적합하며, 고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GM은 2028년 상용화로 포드(2030년 LMR 목표)보다 2년 앞서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 관세 상황: 미국은 중국의 배터리 및 원자재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북미 공급망 강화를 유도하지만, 단기적으로 배터리와 전기차 가격을 높인다. GM은 망간 사용과 루이지애나 망간 공장 투자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 경쟁 환경: 테슬라와 중국 CATL, BYD는 LFP와 고니켈 배터리에서 앞서 있다. LMR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비용과 성능의 균형으로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이 있다. GM은 LMR로 중대형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
장단점
장점
- 비용 절감: LMR 배터리는 코발트와 니켈 대신 망간을 사용해 생산 비용을 리튬철인산(LFP) 수준으로 낮춘다. 이는 전기 트럭과 SUV의 가격을 낮춰 대중화를 촉진할 수 있다.
- 긴 주행거리: 4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는 전기 트럭의 실용성을 높인다. 장거리 운송이나 대형 차량에 적합하며, 소비자의 “충전 불안”을 줄인다.
- 환경 및 윤리적 이점: 코발트 사용 감소는 코발트 채굴의 윤리적 문제(아동 노동, 환경 파괴)를 완화한다. 망간은 채굴 조건이 덜 혹독해 환경 부담이 낮다.
- 공급망 안정성: 망간은 북미(루이지애나)와Really big plus: GM은 루이지애나 망간 공장 투자로 중국산 원자재 의존도를 줄여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성을 높인다.
- 경쟁 우위: GM은 포드보다 2년 빠른 2028년 상용화로 시장 선점 가능성이 있다. 프리즈매틱 셀 디자인은 부품 수를 줄여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
단점
- 상용화 지연: 2028년 상용화까지 3년이 남아 있어 경쟁사(테슬라, CATL)의 기존 배터리 기술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 시장 변화에 따라 기술이 뒤처질 위험도 있다.
- 관세 부담: 망간 사용으로 코발트·니켈 의존도를 줄였지만, 여전히 중국산 부품이나 리튬에 대한 관세(25%)가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
- 기술적 불확실성: LMR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다. 1상 시험 수준의 프로토타입 테스트(150만 마일 내구성)는 유망하지만, 실제 생산과 대규모 적용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환경 우려: 망간 채굴은 코발트보다 덜 문제지만, 여전히 환경 영향을 준다. 배터리 생산과 폐기 과정의 환경 부담은 해결 과제다.
- 시장 수용성: 소비자가 고가의 전기 트럭을 받아들일지, 충전 인프라가 이를 뒷받침할지 불확실하다. 특히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
시사점
- 전기차 가격의 희망: GM의 LMR 배터리는 “코발트는 비싸, 망간은 싸!”를 외치며 전기차 가격을 낮출 잠재력을 가졌다. 400마일 주행거리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다. 이 배터리가 성공하면 전기 트럭 운전사가 “주유소? 그게 뭐지?” 하며 커피나 홀짝일 날이 올지도. 하지만 2028년까지 기다리려면 운전사도 참을성이 트럭급이어야 한다.
- 관세의 덫: 미국의 중국산 배터리 관세는 배터리 가격을 올리고, 전기차 값도 덩달아 뛴다. GM은 망간으로 “관세 피해가자!”를 외치지만, 중국산 리튬이나 부품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건 마치 “중국산 김치 피하려다 국산 고추장 값 오른” 꼴이다. 소비자는 “전기차 살까, 디젤 트럭 살까?” 하며 계산기 두드릴 판이다.
- 북미 공급망의 꿈: GM은 루이지애나 망간 공장으로 “미국산 배터리 만세!”를 외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 하지만 망간 원료가 호주산이라는 게 반전. 이건 “국산 한우!” 외쳤는데 소가 호주산인 상황이다. 그래도 지역 공급망은 장기적으로 비용 안정화에 기여할 거다.
- 치열한 배터리 전쟁: GM이 포드보다 2년 빠른 LMR 상용화를 선언하며 “우리가 먼저다!”라고 소리쳤다. 테슬라는 “흥, 우리도 뭔가 있다”며 뒤에서 칼 갈고 있을 거다. 이건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누가 더 맛있는 양념치킨 내놓나” 경쟁하는 것과 비슷하다. 소비자는 그냥 싸고 좋은 배터리가 나오길 기다리면 된다.
- 환경과 윤리의 보너스: LMR는 코발트 사용을 줄여 “혈액 코발트” 논란을 피한다. 망간 채굴도 상대적으로 덜 혹독하다. 이건 마치 “공정무역 커피” 마시며 뿌듯해하는 기분이다. 하지만 배터리 생산의 환경 부담은 여전하니, GM이 “완전 착한 척”은 못한다.
한국은?
한국에서 GM의 LMR 배터리가 상륙하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 현대차와 기아는 즉각 “우린 LMR보다 더 쩌는 K-배터리 개발 중!”이라며 맞불을 놓는다.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은 “GM? 그건 2등 기술!” 하며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 LG는 이미 망간 배터리 연구 중이니, GM과 “누가 먼저 상용화하나” 치킨게임이 시작될 거다.
한국 네티즌은 X에서 “400마일? 제주도 두 바퀴 돌고도 남네!” 하며 열광하다가, 누가 “근데 충전소는?”이라고 묻자 갑자기 조용해진다. 어떤 유튜버는 “LMR 배터리로 전기 택시 400마일 테스트!” 영상을 올리며 조회수 대박을 노린다. 관세 문제? 한국은 중국산 부품 좀 써도 “K-관세 회피술”로 슬쩍 넘어가려 할지도. LMR이 성공하면 서울 거리엔 전기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넘쳐나 “내연기관차는 이제 박물관행!” 소리가 들릴 거다. 하지만 GM, 한국 오려면 먼저 전국 충전소 확충에 투자부터 해라!
결론
GM의 LMR 배터리는 망간을 활용해 비용을 낮추고 400마일 주행거리를 제공하며, 2028년 전기 트럜과 SUV 시장을 겨냥한다. 코발트·니켈 사용 감소와 루이지애나 망간 공장 투자는 관세 부담을 줄이고 북미 공급망을 강화한다. 하지만 2028년 상용화까지 3년, 관세로 인한 비용 상승, 기술적 불확실성은 도전 과제다. 한국에선 LMR이 전기차 대중화를 앞당길 잠재력이 있지만, 충전 인프라와 네티즌의 밈 전쟁부터 대비해야 한다.
'첨단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글로벌 에어택시 상용화 사례 비교와 한국의 준비 현황 및 시사점 (0) | 2025.05.18 |
|---|---|
| SpaceX의 Starship 테스트 성공 요약: 한국은? (0) | 2025.05.15 |
| 기술이 몰려온다! 사회적 위험과 맞짱 뜨기 (3) | 2025.05.14 |
|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쟁 라디오 스타, “플래시” 세르히의 모험! (0) | 2025.05.13 |
| 저고도 경제 구축: 드론과 전기 비행 차량이 도시를 뒤바꾼다! (4) | 2025.05.13 |